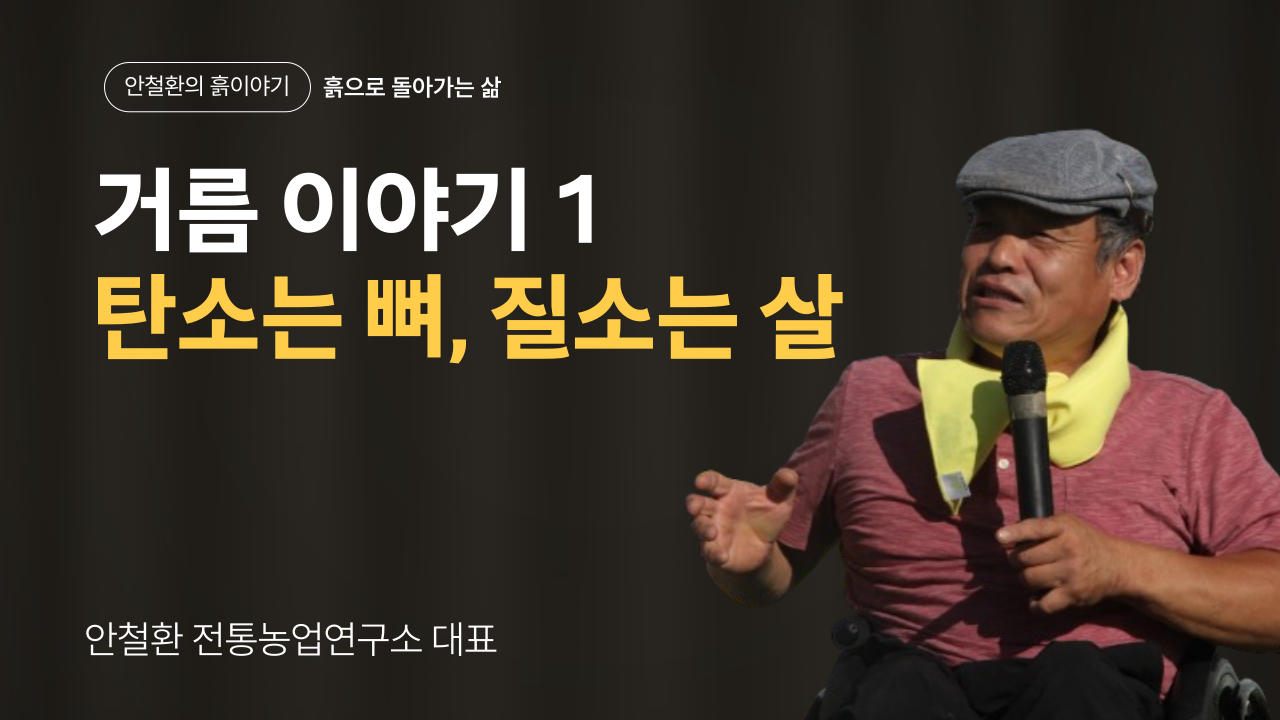
흙으로 돌아가는 삶은 죽어서가 아니라 살아서도 가능한 일임을 제가 존경하는 귀농 선배 한 분에게서 배웠습니다. 그 분은 귀농해서 아주 소박하고 예쁜 뒷간을 직접 만들어 놓고는 정작 자신은 볼 일을 뒷간에서 보지 않고 밭에 들어가 봤답니다. 한 손엔 호미, 다른 손엔 물 한 바가지 들고 적당한 자리 찾아 호미로 구멍 판 다음 일 보고 물 한 바가지로 비데 하면 끝. 그게 매일 흙으로 돌아가는 방법이라니 재밌죠. 똥은 나의 분신이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나의 분신이 매일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 흙 또한 나의 분신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느님이 그 흙으로 나를 빚었으니 내가 거꾸로 흙의 분신이기도 하겠죠.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하느님이 흙으로 빚은 다음 당신의 숨을 불어넣어 인간을 완성했으니 나는 하느님과 흙의 합작품일 겁니다. 동양에선 하느님을 양(陽)이라 하고 흙을 음(陰)이라 했으니 나는 당연히 하느님인 아버지와 흙인 어머니의 합작품이 되겠지요.
그렇다고 아무 흙이나 생명의 모태가 되는 건 아니고 하느님의 숨이 깃들 때 생명의 흙이 될 수 있다 했지요. 하느님의 숨이 뭐라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따뜻한 바람이자 공기입니다. 생명의 흙에는 물이 있지요. 흙을 기반으로 공기와 물이 만났을 때 비로서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 생명의 흙에 나의 분신인 똥이 매일 들어가 흙의 양분이 되면 흙에는 하느님의 숨이 더 잘 깃들고 더 많은 생명이 잉태될 겁니다. 그렇게 흙에 살다 결국 죽어서도 흙으로 돌아간다면, 나뿐이 아니라 나의 조상이 그랬듯이 나의 후손들도 그렇게 흙으로 돌아간다면 흙은 거룩한 생명의 신전이 되는 거라 나는 역설하곤 합니다. 가끔 교회나 성당 가서 농사 얘기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느님은 콘크리트로 지은 예배당보다는 저 생명의 흙을 더 좋아하실 거라 기염을 토하곤 하지요.
그래서 똥을 비롯해 내 몸과 생활에서 나오는 유기부산물을 거름으로 만들어 흙으로 돌려보내는 일은 단지 먹을거리 생산을 위한 것만이 아닌 흙을 살아있는 생명의 신전으로 만드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 밭에 먹을거리 작물만 자라지 않고, 온갖 풀과 벌레와 지렁이와 미생물, 꿀벌과 무서운 말벌, 귀여운 새와 두더지와 개구리, 능사와 살모사 같은 뱀 등 갖은 생명들이 어울려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순환의 힘
한 때 무투입순환농법이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 거름도 주지 않고 작물을 키워 수확을 할 수 있다니 놀라울만 하죠. 저는 반박했습니다. 내가 먹고 눈 똥을 흙에다 주지 않으면 똥은 어디다 버리나, 내 농장에서 나온 먹거리를 이웃과 나눠 먹으면 이웃의 똥은 또 어디다 버리나, 우주에다 버릴 수는 없는 일, 부득이 내 농장이 아닌 어딘가에다 버려야 할텐데 그러면 내 똥은 자연을 더럽히는 오염원이 되는 것 아닌가 했지요. 또 흙에서 나온 걸 흙에다 돌려주지 않고 빼 먹기만 하다 흙의 지력을 다 빼먹게 되면 나중엔 농사조차 되지 않는 사막이 되고 말 것이다 했죠.
그런데 제 비판은 나중에 보니 일면적인 이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투입순환농법은 무조건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게 아니고 내 농장에 순환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게끔 하는 게 핵심이라는 걸 나중에 안 거죠. 요즘 말로 예를들면 탄소가 제 농장에서 잘 순환되도록 하면 탄소중립은 절로 이뤄진다는 겁니다. 탄소가 배출된만큼 탄소를 사냥하는 거지요. 탄소배출이란 수확물을 말합니다. 식물의 광합성 활동으로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탄수화물과 단백질을 만드는 게 열매고 이삭이지요. 물론 수확물 외에 낙엽 등 농사부산물도 포함해야겠지요. 농사 부산물과 함께 수확물을 먹고 남은 부산물은 다시 땅으로 돌아가게 하는 일, 바로 이게 농장 순환 시스템인 겁니다.
탄소 순환만이 아닌 질소 순환도 매우 중요합니다. 질소는 단백질의 핵심 원소이고 단백질 부산물의 핵심이기도 하지요. 질소는 주로 암모니와 결합을 잘해 냄새가 납니다. 그게 똥 냄새이고 썩는 냄새입니다. 그런데 질소 순환은 탄소 순환과 비슷하면서 조금 복잡한 면이 있어요. 질소는 똥과 오줌에 많지만 빗물에도 있습니다. 대기 중 질소가 제일 많잖아요. 비가 그런 대기를 통과하면서 질소를 머금는 거에요. 번개 구름에서 내리는 비는 질소를 더 많이 머금게 됩니다. 번개의 엄청난 전기에너지가 질소를 더 많이 고정해 비와 함께 내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늘의 비와 햇빛 에너지가 내 농장에 탄소와 질소 비료를 만들어 공급해주는 것이기에 순환시스템이 잘 작동하면 외부에서 비료를 투입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요. 더불어 내 농장에서 흙과 양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여름 폭염과 폭우, 한 겨울 한파와 가뭄 등이 내 땅의 흙과 양분을 말리거든요. 이걸 예방하는 것도 순환시스템의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농장에서 농사지은 지 25년 동안 경운하지 않고, 모든 걸 순환시켜 퇴비 만들어 주는 농사를 하다보니 지력이 쌓여 몇 년전부터는 밑거름을 주지 않고 오줌으로 웃거름만 주며 농사짓게 되었습니다. 밑거름은 옥수수와 호박 같이 다비성 작물에게만 주고 맙니다. 산림과학원 지정 산림생태텃밭(일명 먹거리숲) 조성하며 틀밭을 만든 이후 틀밭이 흙의 유실, 침식을 막아주고 지력을 지켜주어 더 거름을 주지 않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저희 퇴비장독대에 만들어 둔 퇴비들이 그대로 쌓여있게 되었으니 그것도 골치거리가 되고 있네요.
암튼 그래도 무투입순환농법이란 표현은 오해가 있어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칫 게으른 농사를 조장할 수 있구요. 그냥 순환농법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거름의 뼈는 탄소, 살은 질소
똥이나 남은음식물로 거름 만들 때 꼭 톱밥을 섞어주어야 합니다. 똥과 남은음식물은 질소가 주 재료이고, 톱밥은 탄소가 주 재료입니다. 이 재료들을 분해하는 미생물에게 톱밥은 밥이고 질소는 밑반찬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탄소질은 뼈이고 질소질은 살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미생물이 이 재료들을 분해할 때는 적당한 비율의 물과 공기가 필수입니다. 이 중에 공기가 더 중요한 발효를 호기(好氣)발효라 하고, 공기를 좋아하지 않는 발효를 혐기(嫌氣)발효라 합니다. 퇴비 만들기는 호기발효가 좋습니다. 혐기발효는 오줌 같은 액체비료 숙성시킬 때가 적당합니다.
호기 발효를 시킬 때 퇴비의 주 재료는 톱밥 같은 탄소질 재료입니다. 그렇다고 톱밥만 있으면 발효는 아주 지체됩니다. 여기에 질소질 재료가 첨가되어야 발효가 잘 일어나지요. 탄소질과 질소질의 비율은 보통 20~30:1로 이를 탄질비, 탄질율(C/N)이라 합니다. 비율로만 봐도 탄소질이 질소질보다 20~30배는 많아야 발효가 잘 된다는 것인데요, 그러면 탄소질 재료인 톱밥이 너무 많아 퇴비 만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시중에 판매되는 공장식 축분 퇴비들에는 톱밥이 20% 정도밖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정도 비율이면 발효가 잘 일어나지 않아 강제로 온도를 가해주고 공기도 넣어주며 더불어 미생물 발효제도 넣어주는 겁니다.
저희가 퇴비 교육할 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음식물찌꺼기를 질소질 재료로 하고 톱밥을 섞어주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인공은 음식물이 아니라 톱밥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땅에 퇴비를 넣어주는 건 땅의 지력(땅심)을 높여주기 위함인데 땅심의 주인공이 바로 탄소질 재료, 곧 톱밥이기 때문이에요.
톱밥 같은 목질부에는 리그닌이라는 섬유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땅심을 높여주는 탄소질의 핵심입니다. 낙엽이나 왕겨 같은 초본류에는 셀룰로오즈라는 탄소질이 있는데 리그닌만 못하지요. 리그닌은 토양 속 호기성 미생물들이 아주 좋아해 먹고 난 후 접착 성분을 만들어 흙의 입단화, 곧 떼알구조의 흙을 만들어 줍니다. 여기엔 숨구멍, 물구멍이 많아 흙이 푹신푹신해지지요. 이 흙 틈새 벽면엔 미생물이 먹이를 먹고 만든 유기물을 코팅해 놓습니다. 그래서 식물들이 흙 틈새로 뿌리를 뻗고 틈새의 물을 흡수하고 벽면에 코팅된 유기물을 먹이삼아 먹고 사는 겁니다. 당연히 틈새에 사는 수많은 미생물도 식물 뿌리에 기대 식물이 뿌리로 뱉어내는 배출물을 먹고 뿌리에겐 요긴한 양분도 제공하며 공생하는 거지요.
아궁이 불을 많이 떼던 옛날엔 재가 아주 훌륭한 탄소질 재료였습니다. 거름 대용으로 쓰기 위해 산에서 훑어오던 참나무 갈잎의 잎줄기에도 탄소질 재료가 많았어요. 지금은 재도 별로 없고 참나무 갈잎은 훑어올 엄두도 못 내지요.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가을이면 쏟아지는 낙엽입니다. 잎에는 셀룰로오즈가 많지만 잎줄기에는 리그닌이 풍부하거든요. 더구나 우거지는 산 숲을 정리하기 위한 간벌로 잔가지 우드칩이 처치 곤란일만큼 많아 이 또한 톱밥 대용으로 쓰면 아주 요긴할 것입니다.
탄소질 재료는 골치일만큼 많은데도 사회적 시스템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쓰질 못하니 저는 주로 목공소의 원목 톱밥을 얻어 씁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의미는 있으나 원목 대부분이 수입산이 많아 아쉬움이 많아요. 기후위기 시대에 하루빨리 자원순환이 생활화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 글에선 퇴비만들기의 실재를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럼'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베를린 도시농업의 다양성 - 임대 텃밭, 합법적 게릴라 가드닝, 도시 채집농, 먹거리숲 (2) | 2025.04.11 |
|---|---|
| 식용도시 10문 10답 - 2부, 기후전환시대 식용도시의 의미 (2) | 2025.03.17 |
| 식용도시(Edible City) 10문 10답 - 1부 식용도시란? (0) | 2025.02.18 |
| [흙에서 살다 6] 경운 이야기, 흙은 왜 딱딱해질까? (1) | 2025.02.18 |
| [흙에서 살다5] 흙을 지키는 나무, 나무와 혼작하기 (1) | 2025.0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