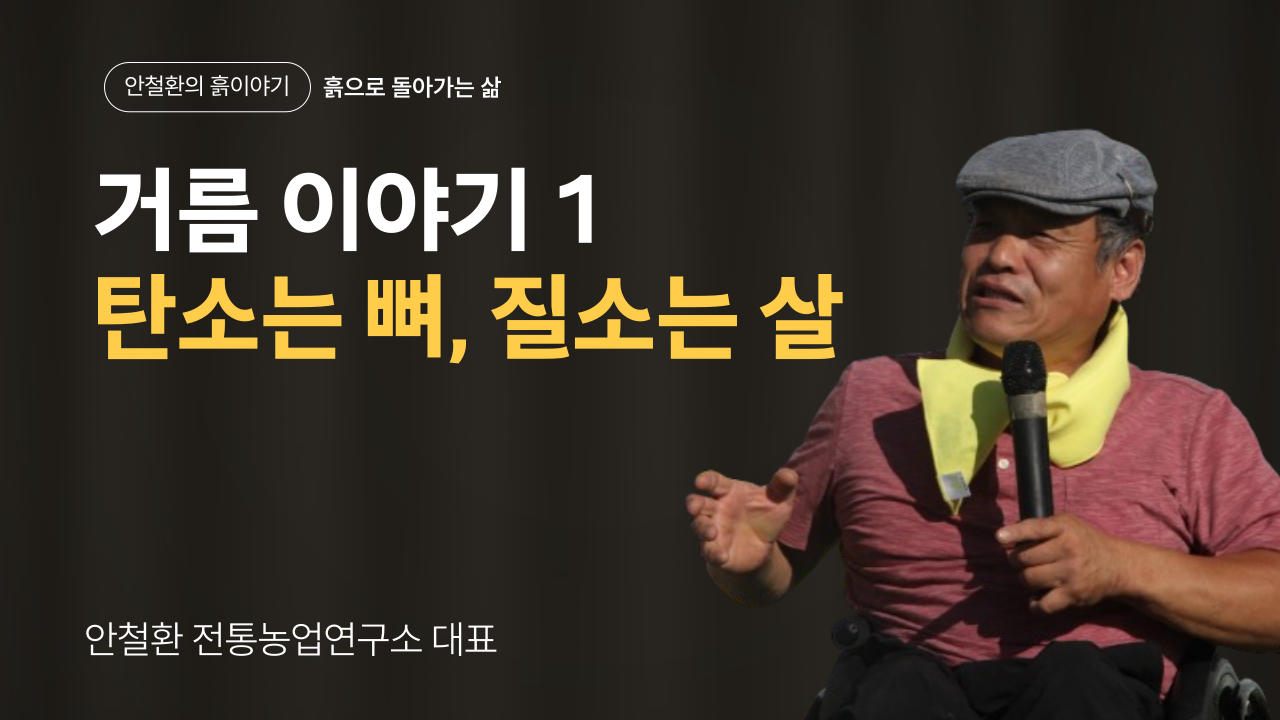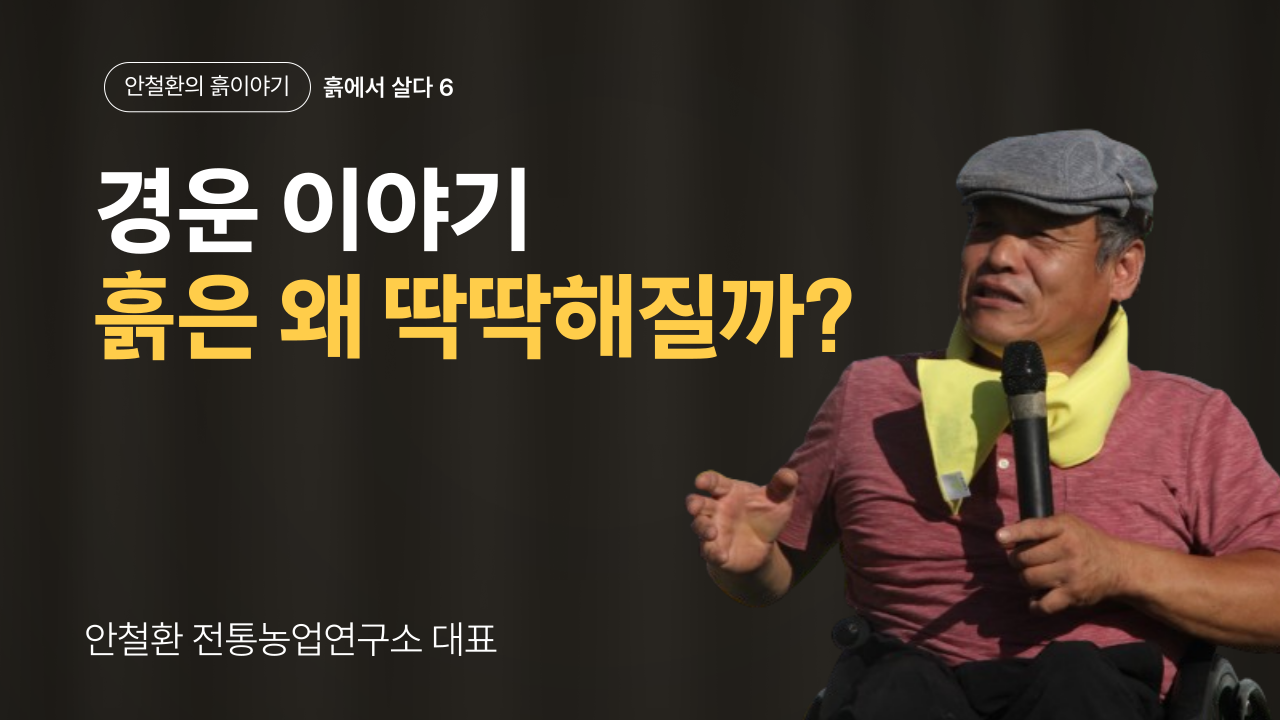'건강한농부'는 2013년 금천구 친환경 주말농장 ‘한내텃밭’을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을 당시 임의단체로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에 협동조합으로, 2017년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했습니다. 도시농업 초창기, 2년 한시로 운영되었던 ‘한내텃밭’이 사라진 후에도 도시농업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시킬 방법을 고민하면서 금천도시농업네트워크는 주말농장을 중심으로 텃밭 활동과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는 학교나 옥상 등 자투리 공간에 텃밭을 조성하고 공유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건강한농부'는 텃밭 조성 사업 중심에서 먹거리 활동으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2017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법인체를 변경하고, 금천구 커뮤니티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동네커뮤니..